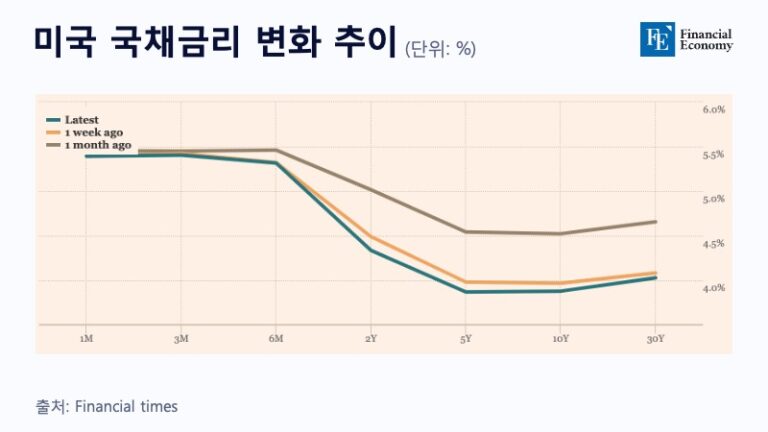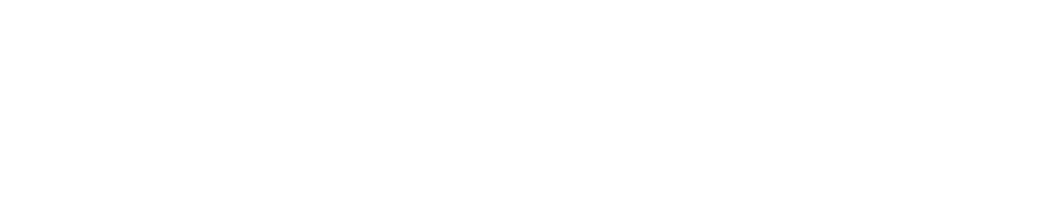홍콩 ELS 자율배상안 발표에 고심 깊어지는 은행권, 조 단위 배상 불가피
금융권, '홍콩 ELS' 분쟁조전기준안 관련 대책 회의 돌입 KB 판매 ELS만 5조원 육박, 조 단위 배상 피하기 어려워 "공모형 ELS 판매 허용한 금융 당국도 책임져야" 비판도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이 발표되면서 은행들이 본격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현재로선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외부 배상위원회를 꾸려 자율배상에 착수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배상비율이 20~60% 수준으로 넓게 분포돼 있는 데다 배상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자율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자율배상 수용 여부 검토에 돌입한 은행권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ELS 분쟁조정기준안이 발표된 이후 은행들은 각자 대책회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향후 홍콩 H지수 추이 등을 감안해 손실 규모 대비 20∼40% 수준에서 배상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해당 계좌가 24만3,000개에 달하는 점과 투자자별로 20여 개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배상 규모 산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자 다른 명칭의 배상위원회도 꾸려야 한다.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ELS 배상위원회(가칭)’을 조성해 개인에 대한 배상률을 심의·의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는 피해자 수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으나, 현재 ELS는 은행별로 수만 명에 이르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배상 금액 산정 외에도 배임 가능성이 남아 있어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할 시 현직 최고경영책임자(CEO)를 포함한 임원의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부분 은행들은 배상액을 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현금주의 회계처리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이를 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경영진의 고민이 크다. 이사진 설득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DLF 사태 때도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두고 각론을 펼친 전례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통상 금융사의 자율배상 안건은 배임의 여지가 있어 금융지주 이사진들이 자율배상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법적·행정적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금융 당국의 자율배상 압박에 대립각을 세우려는 금융사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민원인과 배상비율을 두고 합의가 도출이 안 될 수도 있고, 금융지주 이사회로부터 자율배상에 동의를 얻기까지도 시일이 필요한 만큼 단번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행들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지켜보겠다”
은행들은 일단 다음 달 중 개최되는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대표 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데, 분조위의 조정결정과 당사자 수락 후 조정 성립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된다. 은행들의 자율배상 여부도 ‘사실조사 및 검토→분조위 회부→조정결정 통보→금융사·투자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투자자 배상이 이뤄지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사례 외 분쟁 민원은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자율조정 과정에서 은행과 가입자의 이견이 갈릴 경우 소송으로 가게 된다. 앞서 DLF 사태 당시 가입자의 90%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배상 문제가 일단락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투자자 수가 많은 데다 판매금액도 당시 10배 이상인 만큼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들은 금감원 기준안에 대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DLF보다 강조됐다”고 평가했다. ELS 가입금액이 2억원 초과면 판매사 책임이 10%p 감경되고 앞선 ELS 투자에서 손실을 경험했을 때 10%p 추가 감경되는 등 투자자 책임도 명시됐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재가입자의 투자 횟수가 21회 이상인 투자자부터 판매자 책임이 경감되는 점 등을 두고 판매사의 책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견해도 있다.

손실 피하기 어려운 은행권, “관치금융 버려야 한다” 지적도
은행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번 ELS 사태를 매듭짓기까지 상당한 손실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판매한 ELS(ELS의 신탁 형태 ELT, 펀드 형태 ELF) 중에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8조4,1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이 판매한 규모만 4조7,726억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신한은행이 1조3,766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고, 농협은행이 1조4,833억원, 하나은행 7,526억원, 우리은행 249억원 순이다.
은행권이 판매한 ELS 전체가 배상 대상이라고 가정하고 손실률을 현재 기준인 53.5%로 잡았을 때, 배상비율이 20~60%에서 결정될 경우 은행들은 1조5,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 수준을 배상해야 한다. 지난해 1분기 국내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이 약 4조9,000억원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내려질 과징금은 별도다. 지난달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이 18조8,000억원이고 올 연말까지 누적 손실액이 5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은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은행 전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ELS 등 고난도·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이라는 과제도 떠안게 됐다.
이에 은행권에선 과징금을 자율배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이전의 사례라 케이스가 조금은 다르지만, 앞선 DLF·라임펀드 사태 당시에 비해선 (거론되는) 과징금 규모가 큰 편”이라며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불완전판매 여부도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지렛대 삼아 부과하는 게 뚜렷한 명분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DLF 사태 대책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권의 로비에 굴복한 금융 당국은 결국 홍콩 H지수와 같은 ‘공모형 ELS’ 판매를 허용했다. 이번 ELS 사태가 일어난 이유다. 파생금융 투자 실패 사태가 불거질 때마다 금융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관치금융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를 끊어내지 않으면 언제든 제2의 키코 대란, 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